음악으로 삶을 건너온 사람
최원영은 노래와 침묵 사이에서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입니다. 그는 단순히 곡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으로 시간을 건너고, 사람을 잇고, 기억을 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최원영의 Music Room
이곳은 그의 기억과 노래가 모이는 방입니다.
그가 쓴 가사, 불러온 멜로디, 그리워한 사람들, 다시 만난 벗들이 함께 머무는 곳입니다.
음악은 흐르고, 추억은 깨어나고, 당신도 이 방 어딘가에서 그와 함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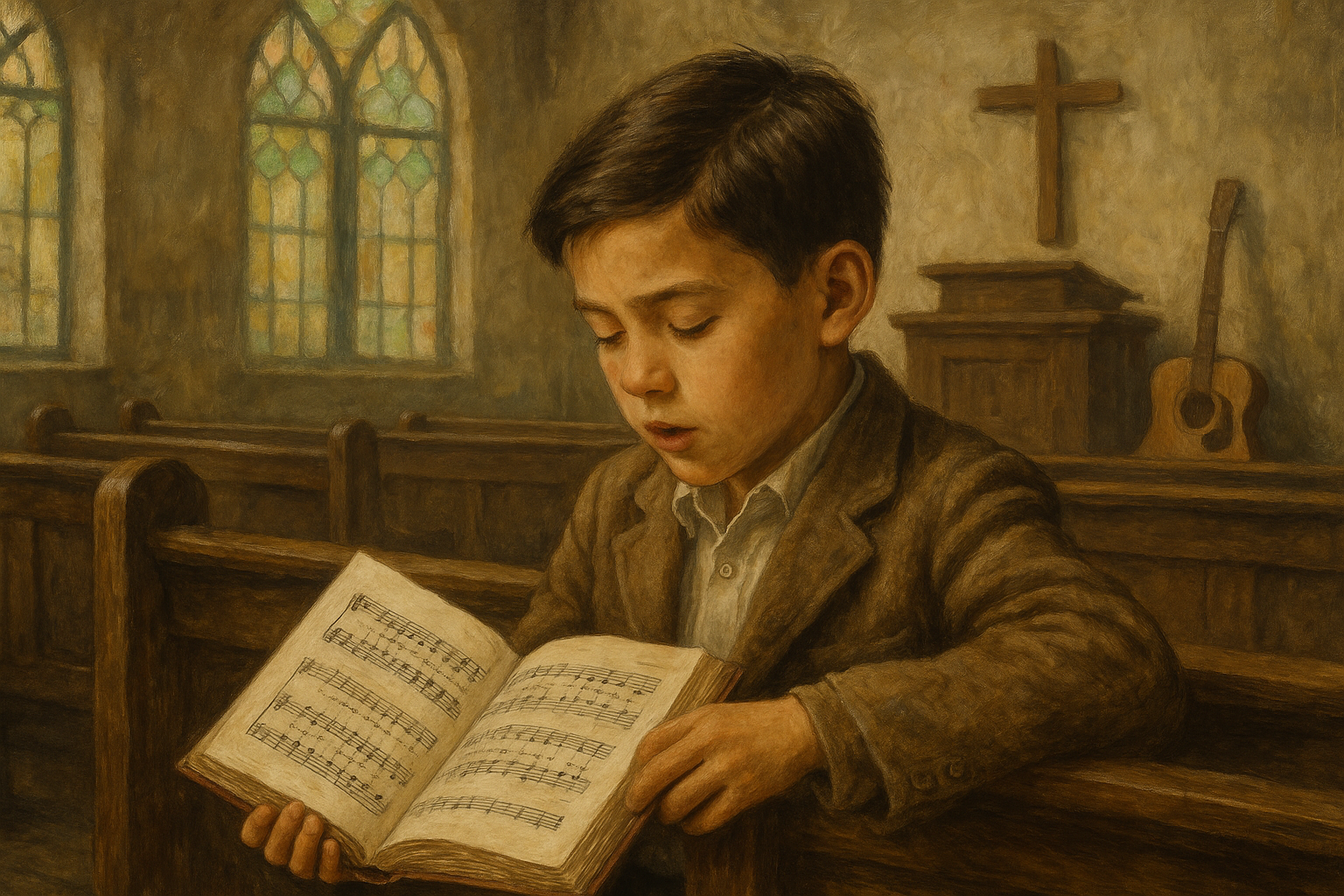
어린 시절, 찬송가와 포크송 사이에서
서울 서소문에 있는 ‘평안교회’ 주일학교에서 찬송가를 부르던 소년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참 반가운 신도여”의 베이스 파트를 흥얼거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Peter, Paul and Mary의 노래는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화음은 어딘가 불안하면서도 매혹적이었고, ‘Gone the Rainbow’나 ‘Puff, the magic dragon’을 따라 부르던 그 시절, 음악은 이미 그의 운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충동 자택의 지하실에서는 김민기가 만든 지 며칠 안 된 <아침 이슬>을 그에게 들려주며 감동을 나눴고, 또 다른 벗 한돌과는 함께 기타를 치며 포크송을 불렀습니다. 그 시절, 그가 가사를 쓰고 한돌이 곡을 붙여 만든 노래가 바로 40여 년이 지나 다시 불려진 〈꿈 속에서〉입니다.
고전음악, 그리고 '필하모니'라는 음악감상실
청춘의 음악이 포크였다면, 청년의 음악은 클래식이었습니다.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에 깊은 감동을 받은 그는 직접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고, 영락교회 성가대에서 바흐를 연주했습니다. 이후 레코드를 모으며 고전음악에 심취하게 되었고, 서울 충무로에 120평 규모의 음악 감상실 ‘필하모니’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음악 애호가, 문학 청년, 유신 시대를 저항하는 학생들이 어우러진 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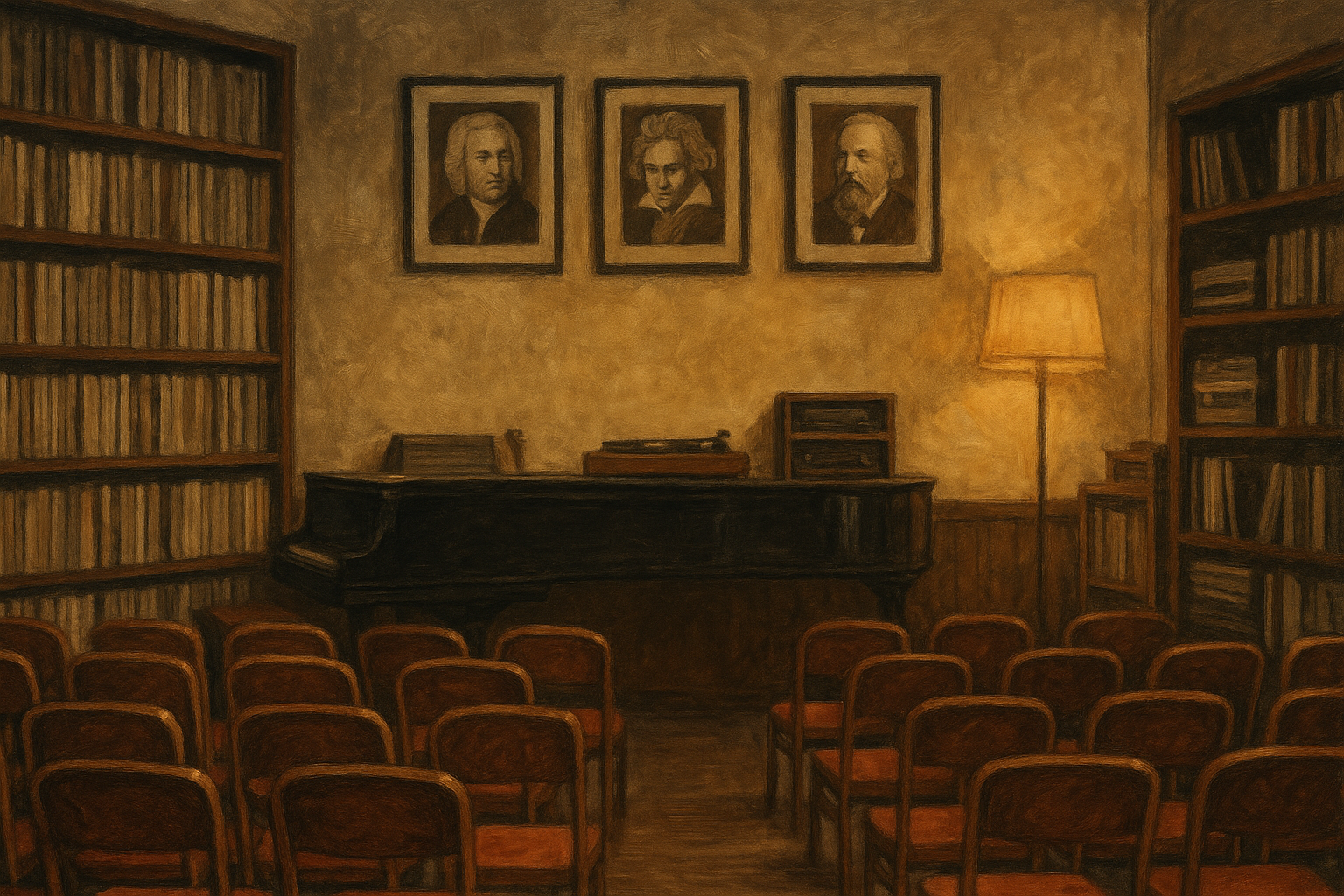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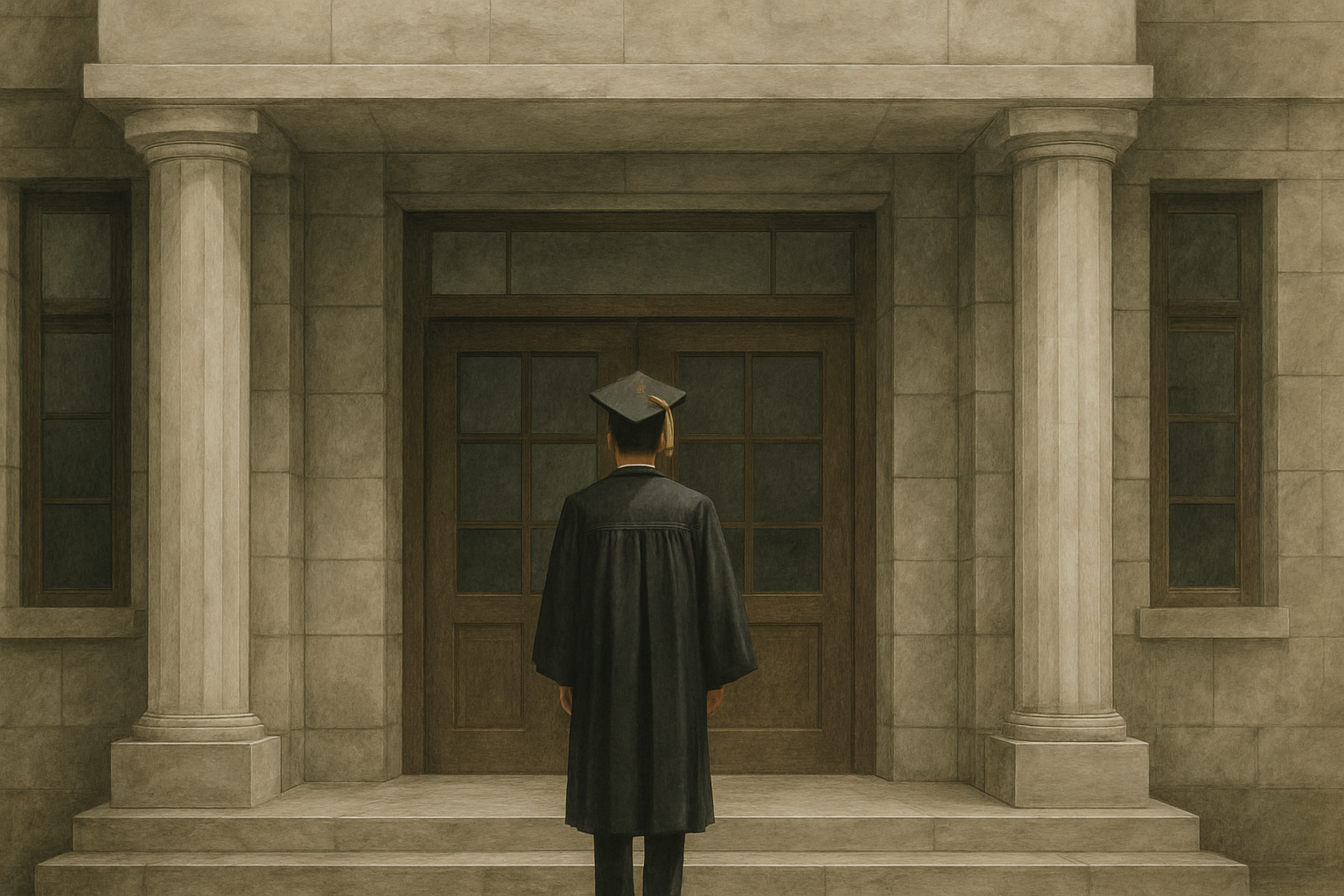
음악을 향한 또 한 걸음 – 서울대 음악대학원
필하모니를 만든 이후, 그는 플루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기악과에 입학합니다. 입시곡은 현대 프랑스 작곡가 **다리우스 미요(Darius Milhaud)**의 작품이었고, 비전공자로서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최종 면접 당시, 심사 교수는 “최원영 씨가 입학하면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중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 입학 후에도 플루트를 꾸준히 계속 불겠다는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다짐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첫 번째 사례는 법대를 졸업하고 국악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황병기 선생이었습니다.
이후 최원영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 이택주, 베이스 수석 안동혁 등과 함께 ‘예음 클럽’을 만들어 실내악 운동을 펼쳤습니다.
작곡가로서의 길
그는 수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 20여 곡으로, 유명 바리톤 박흥우가 부른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최근 곡인 《임진강의 노래》는 민족의 화해, 자연의 포용을 노래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곡으로서 《우리겨레》, 《디엠지 동산에서》와 함께 부르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